Research
저의 전공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지구내부로 깊이 들어가면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직접 들어 갈 수 없으므로, 실험실에서 고온고압 장비를 사용하여 지구내부에서의 암석과 광물의 변형 및 물성을 연구합니다.
지구의 내부 지각과 맨틀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발생과 화산의 활동을 이해하고, 국내 및 세계 여러 지역의 야외조사와 암석 분석을 통해 지구표면에서 볼 수 있는 암석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밝혀내고자 합니다. 즉, 첨단 실험기기를 사용해 실험을 하고, 또한 자연 상의 실제 암석을 최신 기기들을 사용해 분석하여 살아 숨쉬는 지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지각의 중부 ~15km 에서 발생한 경주지진, 그리고 지하 수백 킬로미터 깊이에서의 지진발생 메커니즘은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하에 있는 깊은 층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지진발생의 ‘깊은 내막’을 규명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지진 연구는 대략, 얕은 층(0~60㎞), 중간 층(60~300㎞), 깊은 층(300~680㎞)으로 나뉘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고압고온 암석변형실험 장비를 갖춘 곳은 미국에 열 군데 정도이고, 일본도 몇 군데 되지 않을정도로 드뭅니다. 다행히 저는 오레곤대, 미네소타대, 예일대, 캘리포니아주립대, 카네기 지구물리 연구소, 미국 Argon National Laboratory,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등을 거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실험실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고온-고압 암석변형실험 장비를 구축하였고, 세계에서 유일한 고압 암석변형기기도 만들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렴대에서의 지구 내부의 움직임을 살피고, 이곳에서 지진의 발생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경주지진을 포함한 판 내부에서 생기는 지진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지진파의 전파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것은 아직 신비에 싸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난제들을 풀어내는 것 입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지하로 조금만 내려가도 압력과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암석이 부드러워져, 그것이 부러져서 단층이 일어나는 지진은 쉽지 않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고압, 고온의 조건에서도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직 과학계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고, 여러 가설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저의 연구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2004년 “네이처“ 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규명했는데, 1960년대부터 논문발표 전까지만 해도 ‘상 전이 (phase transformation)후 전체 볼륨(volume)이 커 져야 지진이 일어난다’는 가설이 정설처럼 여겨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논문은 250㎞ 깊이에서도 ‘볼륨에 관계없이 물이 나오면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입증했던 바 있습니다.
또, 2001년 ”사이언스“ 지에 ”물의 유무” 와 “스트레스(힘)의 강약”에 따라 감람석의 배열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밝혀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감람석의 배열구조를 통해 지진파의 전파속도 및 비등방성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구에 이어, 앞으로 국내와 세계의 지각과 맨틀 상부에서 올라온 암석들을 대상으로 암석의 변형구조, 미세구조 등을 연구해서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하에서의 지진파 전파속도의 특성과 궁극적으로 지체구조를 밝혀내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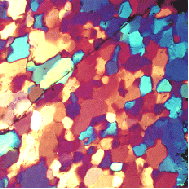
Fig. 1 실험실에서 변형된 olivine crystals
(deformed at P = 2 GPa, equivalent to ~60 km depth) andT = 1573 K).
Mineral preferred orientation is used to understand
seismic anisotropy of the upper man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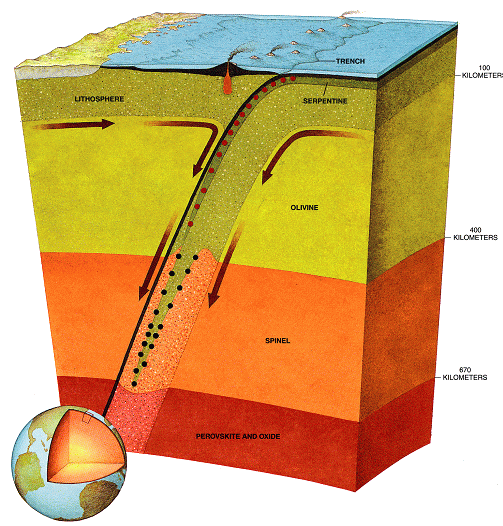
Fig. 2 수렴대에서 심부 지진이 일어나는 곳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체구조물리학 연구실
정해명 교수
